블라인드 - Beyond the surface, 블라인드(2011)
작성자 정보
- 블라인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
목록
본문
Beyond the surface, 블라인드(2011)
블라인드 Beyond the surface, Text analysis, Blind (2011) I) 젠더
영화 ‘블라인드’는 피해자는 여성, 범인은 남성이라는 범죄물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탈피했다. 영화는 주인공인 수아(배우 김하늘)에게 단순히 범행을 당하는 피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목격자’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하고 범인과 대척하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사진.1 목격자로서 경찰서에 출두해 사건을 진술하는 수아
영화 ‘블라인드’는 시각장애인인 ‘수아’ (배우 김하늘) 의 목격을 토대로 범인을 추격하는 범죄 수사 극이다. 시각장애인인 수아는 비오는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는 택시 안에서 수아와 약간의 실랑이 중에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치게 된다. 택시 기사는 수아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이용해 사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만, 경찰대를 수석 입학하고 경찰 견습생이었던 수아는 택시 기사를 수상하게 여기고 기사와 대척하게 된다. 수아는 절대적인 핸디캡으로 위험에 처하지만, 때마침 다른 승용차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난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신고를 하고 목격자 신분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격자로서도 무시를 당하지만, 시각을 제외한 그녀의 관찰력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면서 수사의 진척을 이끌어 낸다.
- 한계점 영화는 수아에게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여성이 단순히 ‘피해자’에 머무르는 범죄스릴러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피했으나 완전히 피해자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극 중 기섭(배우 유승호)의 등장은 수아의 목격자로서의 진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야기하면서 수아 자신과 관객에게 그녀의 목격자로서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에 수아는 사건의 실마리만을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 역할에서 하차한다. 또한 영화 중반부부터 범인이 수아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수아는 목격자가 아닌 보호대상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사진.2 수아의 목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조 형사
또한 영화에서 시각 장애인인 수아가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진다. 이에영화는 조형사(배우 조희봉)를 통해 수아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기섭의(극중 유승호) 등장 이후 조형사에게 수사 진행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는 기존의 범죄 스릴러에서 범인(남성)을 쫓는 추격자가 남성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 역할의 한계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사진.3 범인(남성)을 추격하는 것이 남성임을 보여주는 기존의 범죄 스릴러 살인의 추억(왼쪽),추격자(오른쪽)
- 시사점 중반부부터 수아의 신분이 목격자에서 보호대상자로 바뀌면서 기존의 범죄 스릴러물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극 후반부에 범인과의 대결에서 수아는 다시 주인공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이용해 암전 상태에서 범인과의 대치는 수아의 영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영화는 이를 통해 목격자 → 보호대상자 → 범인 검거자 3단계로 수아의 신분에 변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을 범죄물에서 단순히 범행을 당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닌 매 사건마다 주체적으로 변해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림으로써, 기존의 고정적인 성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사진4. 암전을 이용해서 범인과 대등한 대결을 펼치는 수아
II) 계층 간 대결 영화 ‘블라인드’는 고아출생, 시각장애인인 수아와 소년가장인 기섭이 힘을 합해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의사 범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대결구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새로운 집단에 대한 가능성, 대안적 공동체
영화 ‘블라인드’는 기존의 혈연 위주의 가족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족을 제시한다. 수아는 고아원 출신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가진다. 그래서 친 동생도 아닌 고아원 동생 ‘동수’가 죽었을 때 자신의 동생이 죽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 ‘슬기’와도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나눈다. 영화는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비단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는다.
사진5. 안내견 슬기와 가족과 같은 친밀도를 형성하는 수아
- 한계점 영화에서 기섭(유승호)의 등장은 과거 고아원 동생 ‘동수’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한 수아는 동수를 죽음을 이르게 한 것이 본인이라는 트라우마를 기섭을 통해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지를 다진다. 그러나 영화는 기섭과 수아의 대안 공동체를 위해 수아에게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진짜 남자인 조형사를 범인에 의해 살해당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다.이를 통해 남남이었던 남녀가 결혼해 가족을 이루는 보통적인 가족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다. 내심 조형사와 수아의 멜로를 기대하면서 정상적인 가족의 탄생을 기대했던 관객에게 허탈감을 안긴다. 그러나 영화는 조형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대안 공동체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진6. 범인과 결투 중 살해당하는 조형사
사진7. 사건 이후 친남매와 같은 유대 관게를 형성하는 기섭과 수아
- 시사점 위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는 고아원 원장, 시작 장애인 수아, 소년가장 기섭이 만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스릴러를 선사해 기존 스릴러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스릴러라는 장르에서도 다양한 문제의식을 포함하면서, 대중성까지 갖출 수 있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작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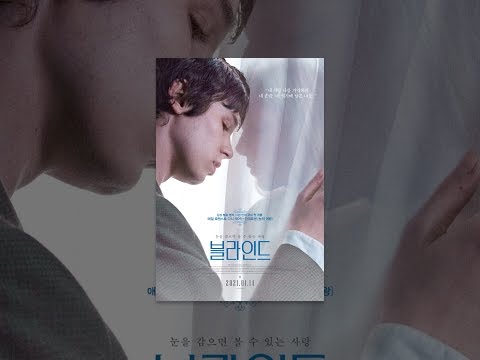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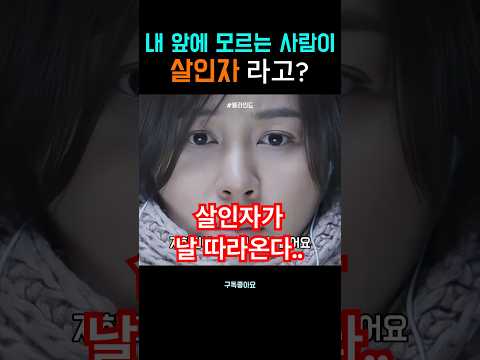
블라인드 Beyond the surface, Text analysis, Blind (2011) I) 젠더
영화 ‘블라인드’는 피해자는 여성, 범인은 남성이라는 범죄물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탈피했다. 영화는 주인공인 수아(배우 김하늘)에게 단순히 범행을 당하는 피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목격자’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하고 범인과 대척하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사진.1 목격자로서 경찰서에 출두해 사건을 진술하는 수아
영화 ‘블라인드’는 시각장애인인 ‘수아’ (배우 김하늘) 의 목격을 토대로 범인을 추격하는 범죄 수사 극이다. 시각장애인인 수아는 비오는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는 택시 안에서 수아와 약간의 실랑이 중에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치게 된다. 택시 기사는 수아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이용해 사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만, 경찰대를 수석 입학하고 경찰 견습생이었던 수아는 택시 기사를 수상하게 여기고 기사와 대척하게 된다. 수아는 절대적인 핸디캡으로 위험에 처하지만, 때마침 다른 승용차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난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신고를 하고 목격자 신분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격자로서도 무시를 당하지만, 시각을 제외한 그녀의 관찰력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면서 수사의 진척을 이끌어 낸다.
- 한계점 영화는 수아에게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여성이 단순히 ‘피해자’에 머무르는 범죄스릴러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피했으나 완전히 피해자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극 중 기섭(배우 유승호)의 등장은 수아의 목격자로서의 진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야기하면서 수아 자신과 관객에게 그녀의 목격자로서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에 수아는 사건의 실마리만을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 역할에서 하차한다. 또한 영화 중반부부터 범인이 수아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수아는 목격자가 아닌 보호대상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사진.2 수아의 목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조 형사
또한 영화에서 시각 장애인인 수아가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진다. 이에영화는 조형사(배우 조희봉)를 통해 수아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기섭의(극중 유승호) 등장 이후 조형사에게 수사 진행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는 기존의 범죄 스릴러에서 범인(남성)을 쫓는 추격자가 남성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 역할의 한계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사진.3 범인(남성)을 추격하는 것이 남성임을 보여주는 기존의 범죄 스릴러 살인의 추억(왼쪽),추격자(오른쪽)
- 시사점 중반부부터 수아의 신분이 목격자에서 보호대상자로 바뀌면서 기존의 범죄 스릴러물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극 후반부에 범인과의 대결에서 수아는 다시 주인공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이용해 암전 상태에서 범인과의 대치는 수아의 영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영화는 이를 통해 목격자 → 보호대상자 → 범인 검거자 3단계로 수아의 신분에 변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을 범죄물에서 단순히 범행을 당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닌 매 사건마다 주체적으로 변해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림으로써, 기존의 고정적인 성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사진4. 암전을 이용해서 범인과 대등한 대결을 펼치는 수아
II) 계층 간 대결 영화 ‘블라인드’는 고아출생, 시각장애인인 수아와 소년가장인 기섭이 힘을 합해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의사 범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대결구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새로운 집단에 대한 가능성, 대안적 공동체
영화 ‘블라인드’는 기존의 혈연 위주의 가족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족을 제시한다. 수아는 고아원 출신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가진다. 그래서 친 동생도 아닌 고아원 동생 ‘동수’가 죽었을 때 자신의 동생이 죽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 ‘슬기’와도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나눈다. 영화는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비단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는다.
사진5. 안내견 슬기와 가족과 같은 친밀도를 형성하는 수아
- 한계점 영화에서 기섭(유승호)의 등장은 과거 고아원 동생 ‘동수’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한 수아는 동수를 죽음을 이르게 한 것이 본인이라는 트라우마를 기섭을 통해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지를 다진다. 그러나 영화는 기섭과 수아의 대안 공동체를 위해 수아에게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진짜 남자인 조형사를 범인에 의해 살해당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다.이를 통해 남남이었던 남녀가 결혼해 가족을 이루는 보통적인 가족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다. 내심 조형사와 수아의 멜로를 기대하면서 정상적인 가족의 탄생을 기대했던 관객에게 허탈감을 안긴다. 그러나 영화는 조형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대안 공동체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진6. 범인과 결투 중 살해당하는 조형사
사진7. 사건 이후 친남매와 같은 유대 관게를 형성하는 기섭과 수아
- 시사점 위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는 고아원 원장, 시작 장애인 수아, 소년가장 기섭이 만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스릴러를 선사해 기존 스릴러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스릴러라는 장르에서도 다양한 문제의식을 포함하면서, 대중성까지 갖출 수 있다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작은 시간
로그인 후 블라인드에 대한 FAQ를 등록해 주세요.
블라인드 관련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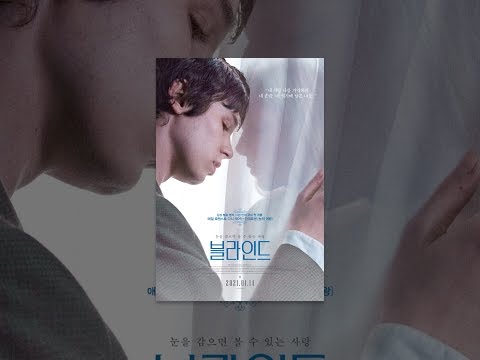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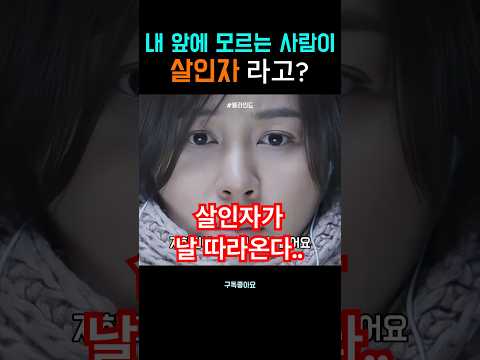
관련자료
-
이전
-
다음